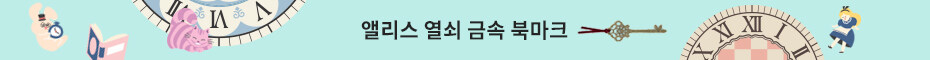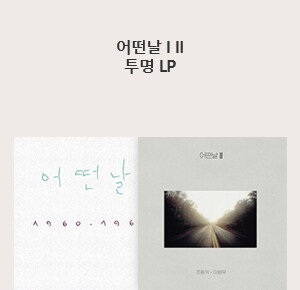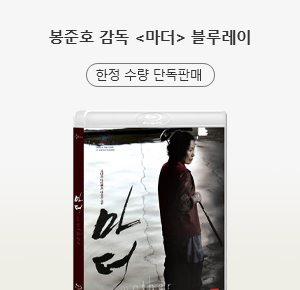|
로랑 캉테(Laurent Cantet)1961년 프랑스 근교 소도시에서 태어났다. 로랑 캉테는 명문 영화학교 이덱을 나왔고, 막스 오필스의 아들인 마르셀 오필스의 조감독으로 유고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철야>를 찍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 프랑스영화계에는 새로운 기운이 생겨났다. 인간의 사적 세계를 미분해 들어가던 그곳 영화의 주류적 흐름과 달리 정치·사회문제를 선정적일 만큼 정면으로 부각시키는 영화들이 나온 것이다. 로랑 캉테는 1999년 38살의 나이로 뒤늦게 데뷔하면서 알랭 기로디, 로베르 게디기앙과 함께 이런 흐름의 대표주자로 올라섰다. 데뷔작 <인력자원부>는 당시 논란이 된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회사에 파업으로 맞서는 노조의 투쟁을 다뤘다. 비전문배우들로 출연진을 꾸리고 음악도 쓰지 않고 영화의 무대를 주인공의 집과 공장으로 제한한 채 이야기를 좁혀 담백하게 끌고 가며 단숨에 주목받는 감독으로 올라섰다. 모처럼 만에 노동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영화를 들고 나타난 그는 수십 년간 줄기차게 노동계급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온 영국의 켄 로치를 떠올리게 했지만 그의 어법은 그보다 차가웠다. 켄 로치처럼 조그만 희망이라도 남겨놓고 북돋우려는 모습이 그에겐 없었다. <인력자원부>는 노조 파업의 결과가 불명확한 채로 끝난다. 거기서 명확해지는 건 대안계급의 가능성은 사라져버리고 사실상 낙오자가 돼버리다시피 한 지금 노동계급의 현실이다. 평단에 이 영화가 급부상한 건 무엇보다 그 섬뜩한 현실의 리얼리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영화 <시간의 사용> 역시 전편의 명성을 이어갔다. 그는 노동하지 않는 것을 유토피아로 인식하는 현실과 대안 없는 노동자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본다. 그리고 육체의 힘과 그 속에 깃든 정신을 이야기한다. <인력자원부>에 이어 만든 <시간의 사용>은 실업에 처한 남자의 삶을 통해 노동하지 못하는 자가 자각하는 존재의식을 명상의 경지까지 이끈다. 이후 4년만에 만든 신작 <남쪽을 향하여>(2005)는 몬트리올로 이민 간 아이티 출신 소설가 다니 라페리에르의 <주인의 육체>의 한 장을 각색한 작품이다. 샤를롯 램플링을 캐스팅해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 색채를 배제하고 여성의 에로티시즘이라는 문제에 천착한 작품으로 역시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대표작
모두보기
  수상내역
|
|
|||||||||||